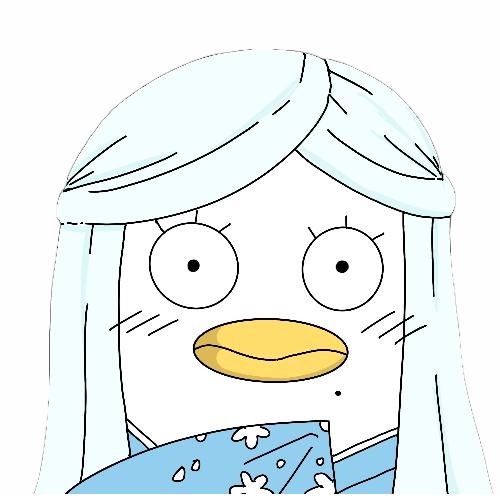북쪽 마을에는 자애로운 신 ‘시라카베 님’을 모시기 위한 신사가 있다. 그 곳에는 시라카베 님께 바치기 위한 곳간이 따로 있는데, 사실 시라카베 님을 위해 바친 것이라지만 그 자애로운 여신의 은혜로 마을 사람들은 한겨울 식 량이 부족할 적에 그곳에서 먹을 것을 조달해왔다. 그것이 이 마을의 규칙이 라면 규칙이었다.
한데 세월이 흘러 외부인이 드나들게 되면서 곳간이 그득히 채워진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던 모양이었다. 심보 나쁜 어떤 자가 곳간 자물쇠를 부숴 놨다. 누구보다 기민하게 그자의 악한 마음을 알아차린 시라카베 사유네는 곧 장 그가 있을 곳에 인기척을 내어 겁을 줬다. 그 덕에 못된 자는 흠칫 놀라 자리를 피해 버렸다.
사유네는 그가 그 이후로 다시 찾아오지 않으리라고 믿었다. 믿어 주었다. 하나 악한 마음을 먹은 인간은 쉽사리 그 속을 바꾸지 않기도 하는 법이다.
이번에는 아예 곳간을 제대로 털 심산이었는지 커다란 가방을 들고선 여기까지 도로 모습을 나타냈다. 그리고 새로 건 자물쇠를 또 부쉈다. 그 순간 부 서진 자물쇠의 파편이 불길하게도 그자의 손가락을 베었다. 핏물이 뚝뚝 떨어 졌다.
주변으로 서릿발이 몰아치는 험한 날씨였다. 그자의 시야가 거의 다 차단 되었다. 그는 가방을 고쳐 메며 허둥지둥거렸다. 설마 이곳이 신성한 신사라 고 해서, 정말로 신이 나타나겠어? 그렇지만 언제나 신은 인간의 예상을 비껴 가는 법이다.
“네 놈, 당장 멈추는 게 좋을 것이야.”
“이, 이런……!”
아무리 못된 심보를 지닌 자라고 해도 신은 단숨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 는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새하얀 북부의 신을 바라보고 뒷걸음질 쳤다. 그의 등 뒤로 싸늘한 눈보라가 더 강하게 몰아쳤다.
“그래, 이제 와 두려움이라도 드는 겐가?”
“시, 시, 시라카베 님…….”
“잘도 내 이름을 입에 올리는구나. 어리석은 네 놈이 두려움의 때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고. 개탄스럽기도 하지.”
사유네가 저벅저벅 그의 앞으로 걸어왔다. 이내 사유네가 발을 한차례 쿵, 구르자 겁을 집어먹은 그자는 기우뚱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는 차디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선 덜덜 떨기 시작했다.
“시, 시라카베 님.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요!”
“……감히 이 앞에서 거짓을 고하는구나.”
서늘하게 얼어붙은 목소리에 숨을 흡 들이켠 그자는 뒷걸음질로 물러나려 다가 다시금 대차게 넘어졌다.
“아, 아이고……!”
사유네는 이미 적잖이 분개한 낯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사유네가 오른손 을 들어 올리자 그 손톱 끝이 서슬 퍼렇게 뾰족해졌다. 사유네의 오른 눈과 오른팔마저 기이하고도 경이로운 신의 형태를 띠며 변모해갔다.
사유네의 새까맣게 물든 오른 눈 흰자위를 본 그자는 숨을 들이켰다. 시라 카베 님이 분노하면 커다란 저주를 받게 된다더라…… 그런 소문쯤은 이 근 방에 사는 자들은 다 들어 봤을 터였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는 것을, 그자는 눈앞에서 실감하고 있었다. 본능을 꿰뚫는 강렬한 두려움이 밀려들었다.
“시라카베 님……! 아이고, 살, 살려 주십쇼. 한 번만 살려 주십쇼.”
“끝까지 제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는 놈에게 삶이란 가치 없지. 이 손톱에 네 놈의 목이 천 갈래로 찢겨도 부족하다.”
그는 두려움에 몸을 벌벌 떨었다. 사유네는 바닥을 구르는 그 형편없는 자 에게 날카로운 손톱 끝으로 뺨을 그었다. 갈라진 살갗에서 핏물이 주룩 흘렀 다. 사유네는 입 끝만 올려 비릿하게 웃음 지었다. 매서운 송곳니가 번뜩였 다.
“네 놈 따위에게도 기회는 충분히 주었을 텐데. 감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할 셈인가?”
“익……! 잘, 잘못했습니다, 시라카베 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요…….”
“다시는……. 네 놈에게 다음 기회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구나. 우습지.”
이윽고 사유네가 날카로운 오른손을 높이 쳐들었다. 그자는 눈을 질끈 감 았다. 그러나 사유네가 그대로 어깨를 떠밀자 저 멀리 몸뚱이가 데굴데굴 굴러갈 따름이었다. 사유네는 청천벽력 같은 호통을 쳤다.
“이 땅에 얼씬도 말아라. 그 낯짝을 다시 보는 순간이, 네 놈의 마지막 날 일 것이야.”
한참을 굴러 저 멀리 떨어진 자가 꾹 감고 있던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새 하얀 북부의 신은 모습을 감추고, 눈발은 여전히 세찼다
'글 > 소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바인 님[넘쳐흐르도록, 강렬하게](+19 BDSM) (0) | 2023.03.01 |
|---|---|
| 비화 님 (0) | 2023.02.15 |
| 남그꼼 님 [따뜻한 눈](동양풍 후궁(망국의 왕세자)X황제 AU) (0) | 2022.12.19 |
| 달세뇨 님 (야쿠자AU(+17) (0) | 2022.11.17 |
| 바인 님 [밀어와 비언어](+19 더티톡) (0) | 2022.10.23 |